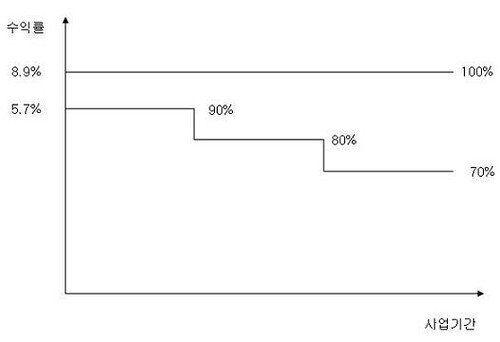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4년 12월 달러가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를 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간지로 꼽히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기사 제목은 ‘달러의 실종’이었다. 얼마 뒤 <뉴스위크>는 ‘믿을 수 없는 달러화 위축’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 공매도를 한 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으며, 또 다른 유명한 투자가는 달러화 공매도가 소위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했다. [중략] 사실 나도 이 광풍에 휩쓸려서 달러화 공매도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가. 달러는 그 광풍이 한창이던 때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 곧바로 반등을 시작해서 달러 지수를 거의 10% 이상 끌어올렸다. [중략] 2005년 늦봄에도 언론은 새로운 광풍을 일으켰다.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활황은 새로운 골드러시이며 거대한 거품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늘 믿을 만하던 매체라 생각했던 <비즈니스위크>의 2005년 4월 11일자 특집 제목은 ‘주택 호황 이후를 생각한다 : 곧 다가올 경기 후퇴는 경제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였다. <포춘>, <워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타임스> 모두 이 합창에 목청을 높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투자전쟁(원제 : Hedgehogging), 바턴 빅스 지음, 이경식 옮김, Human & Books, 2006년, pp245~246]
부유한 은행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한 후, 모건스탠리와 헤지펀드에서 활약한 뛰어난 투자가 바턴 빅스의 투자일지 ‘투자전쟁’의 일부다. 이 글은 ‘시장이 극단으로 달릴 때 개미 군단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작은 절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읽어보면 익히 알겠지만 빅스는 경제지나 전문가들마저 추세예측에 실패한다는 것을 달러화와 부동산 활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말았으니 이번에는 <비즈니스위크>가 맞았고 빅스가 바로 스스로 지적한 “잘못된 선택을 한 개미 군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책을 읽어보면 빅스는 철저한 가치투자자이다. ‘가치투자자’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예측되는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행태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주1) 실제로 ‘투자전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빅스가 전체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유가격 공매도에 나선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양반이 불과 몇 달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부동산 활황을 경고한 언론은 비웃었다.
나는 이 글에서 빅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예측이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대부분은 달러의 폭락을 예측했다. 하지만 달러는 보란 듯이 강세로 – 최소한 보합세로 – 돌아섰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려울수록 달러’라는 신화가 재연된 것이다. 마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1970년대 달러가 더 강고한 기축통화가 되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제예측은 힘들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모든 계(界)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계이기 때문이다. 주요변수들은 존재하지만 그밖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때로 하찮은 변수라 여겨졌던 것들이 주요변수로 수시로 급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사후적인 분석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경제관은 늘 좌우로 갈라지며 각각의 입장에 대한 백가지 변명이 존재한다.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그 예측 자체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실로 경제는 여타 분야와 달리 예측을 하는 그 자신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변수가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개개 경제주체들이 실상은 멀쩡한데도 어느 한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그 은행의 예금을 인출한다면? 정말 망한다. 이것이 bank run이다.
그래도 경제예측은 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구조다. 그런데 또 그 예측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반목을 일으키고, 어떤 이는 횡재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쪽박을 차기도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경제예측 및 계획의 근본한계다. 완벽한 예측과 계획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에 접근해갈 뿐이다. 그럼에도 어떤 이가 자신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면 그는 ‘완벽하게’ 사기꾼이다.(무슨 ‘주가大예측’ 이런 문구 들어가면 100% 사기라 할 수 있다)
(주1) 그래서 이들은 기술적 투자, 모멘텀 투자를 혐오한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