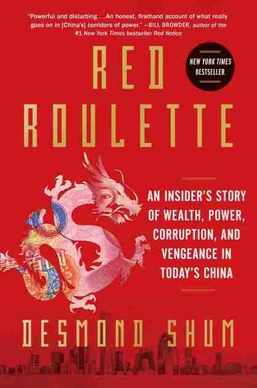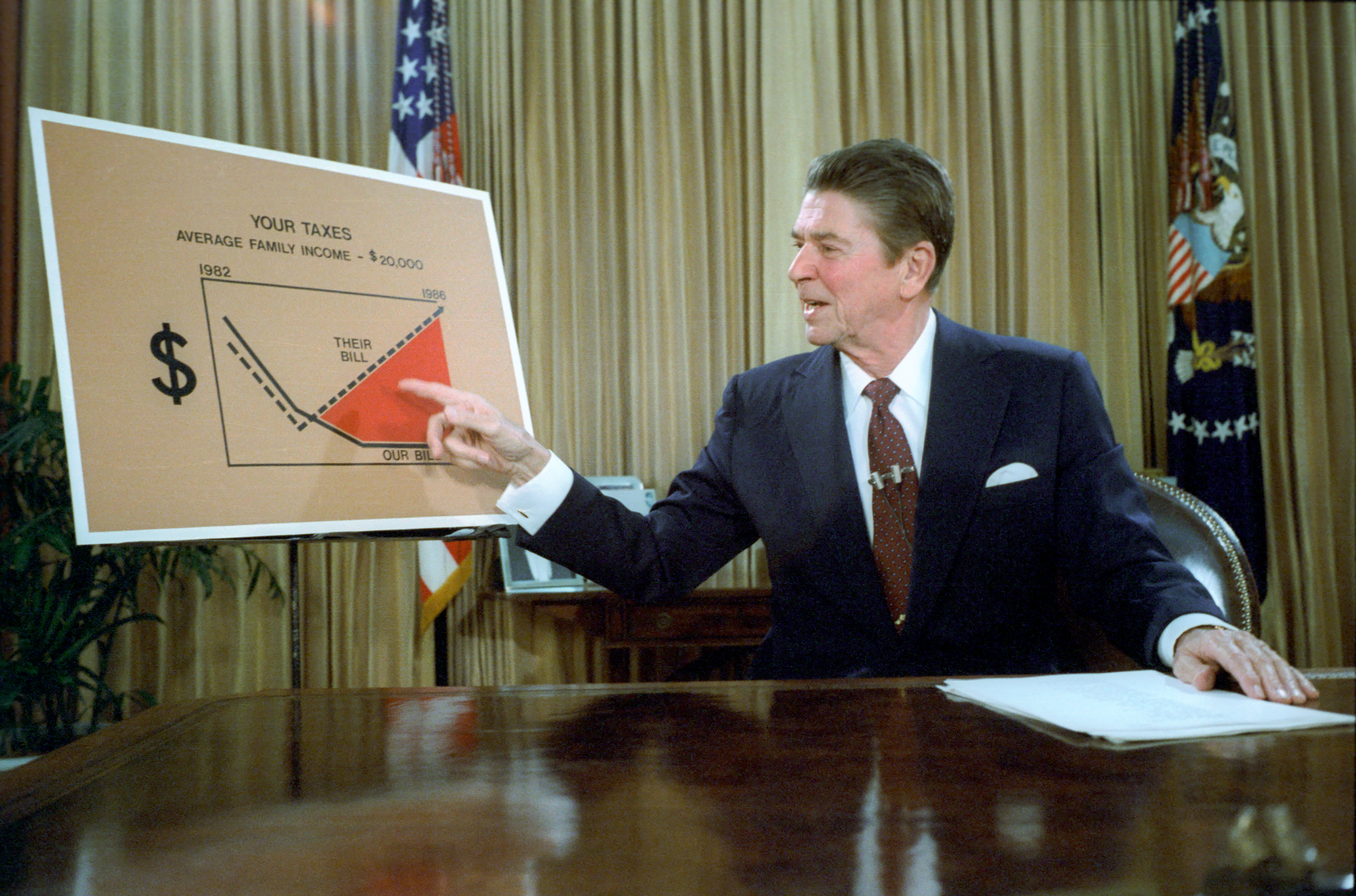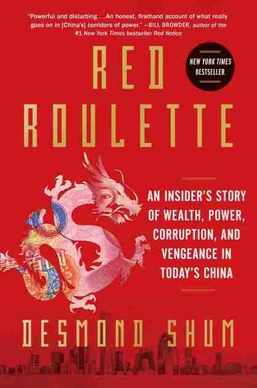
By Desmond Shum – , Fair use, Link
나는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태어났다. 공산당은 중국의 농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모님을 시골로 보냈다. [중략] 상하이 주민 수십만 명이 중국판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 그대로 살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행운이었다. 부모님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중국 농민들의 집에 돌아가며 살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외톨이 신세를 면했다. [레드룰렛, 데즈먼드 슘 지음, 홍석윤 옮김, 알파미디어, 2022년, p23]
작가 데즈먼드 슘은 1968년 11월생으로 문화혁명은 대략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므로 그의 말대로 그가 태어난 해는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였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1960년대 말은 세계 어느 나라나 평화로운 곳이 별로 없긴 했지만, 중국도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격변을 거치고 있던 시기였을 것이고, 이 책은 그 이후 그 문화혁명만큼 또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던 중국사회에 인사이더로 활약했던 작가가 몸소 겪었던 체험담을 담은 책이다.
현대 중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문화혁명 이후 작가가 걸어온 삶은 보통의 중국인과는 좀 다르다.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작가의 부모님은 각고의 노력 끝에 홍콩으로의 이주를 허락받아 그를 데리고 홍콩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머리가 명석했던 작가는 미국으로의 유학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작가는 중국인, 홍콩인, 미국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중국 본토 등에 투자하는 투자사 등에 근무하며 다시 본토에서 머물게 된 작가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후에 배우자가 되는 휘트니 단과의 만남이다. 보통의 순종적인 중국여성과 달리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그는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통해 경제공동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는데 이후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여성으로 바로 훗날 중국의 총리가 되는 원자바오의 배우자였던 장페이리다.
나는 휘트니와 하얏트 호텔 현관에서 나란히 차렷 자세로 서서 손을 흔들었다. [중략] 그녀가 떠나고 휘트니에게 다가가자, 휘트니는 그제야 장 이모가 중국 부총리 중 한 명인 원자바오(溫家寶)의 부인 장페이리(張培莉)라고 말해 주었다. 원 부총리가 이듬해인 2003년에 주룽지의 뒤를 이어 중국의 차기 총리가 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원 부총리는 곧 중국 정부의 수장이자 중국공산당의 이인자가 될 것이다. 휘트니가 그런 사람의 부인과 친구라니,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같은 책, p113]
작가는 이렇게 아내인 휘트니 단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과 인연을 맺으며 소위 ‘꽌시’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은 이후 그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여러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접근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며 중국 권력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몸에 익히게 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중국 사회주의의 맨살은 사회주의 본래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세력 스스로가 또 다른 귀족이 되어 국가의 권력과 이권을 독차지하는 금권주의 사회였다는 것이 작가의 관찰이다.
이들 부부는 핑안보험의 주식 인수, 공항 프로젝트 등을 위해 원자바오 집안뿐만 아니라 왕치산, 쑨정차이 등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이나 중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인 헝다의 쉬자인 회장 등 정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권력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치와 부패에 절어있는 꽌시 비즈니스를 영위한다. 또 한편으로 쩡판즈 등 잘 나가는 화가의 작품을 엄청난 작품료를 지급하며 사거나 노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 전 세계를 찾아 헤매는 등의 광적인 소비에도 몰두하는, 전형적인 자본가의 삶을 만끽한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부의 뜻대로 됐다면 이 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순탄했던 그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게 된 이유가 결국 체제의 작동방식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 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의 교훈이다. 그들의 꽌시는 결국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중국의 권력자는 – 다른 모든 권력이 그렇듯 – 정적의 제거를 위해 그러한 부패 혐의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비리가 외국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휘트니와 나는 보시라이가 중국 기자와 학계의 인맥을 동원해 장 이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악성 소문을 파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뉴욕타임스》의 바르보자 기자는 어떻게 해서 그 기사를 쓰게 되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원자바오에게 복수하려는 보시라이파 인사들로부터 정부를 얻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장 이모는 보시라이에게 충성하는 보안요원들이 홍콩의 바르보자에게 여러 개의 문서 상자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책, p113]
즉,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현재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과 경쟁 관계에 있던 보시라이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 보안부 내의 보시라이파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추측이다.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파는 작가 부부와 원자바오 가족 간의 석연찮은 거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서방 언론에 제공하였고 이 기사가 터지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중국공산당 권력과의 밀월 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부부의 사이도 결정적으로 틀어지고 만다.
이 책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부부의 이혼이 아니다. 작가는 2015년 휘트니 단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그 이후 휘트니는 그들 부부가 지은 중국의 복합건물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갔고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절망한 작가는 舊소련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다 비슷한 방식으로 탈출한 빌 브라우더(Bill Browder)의 회고록 「적색 수배서(Red Notice)」에서 힌트를 얻어 제목을 정해 바로 중국공산당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태어나, 혼합경제 도시 홍콩에서 자라고,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금권주의 화된 중국에서 부를 축적한, 그러면서 중국에서 서구식 자유주의의 도래를 꿈꿨던 어느 자본가의 회고록이다. 그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중국의 미래로 상상하였지만, 책에서 드러난 그의 행적은 아직 봉건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공산당의 퇴행성을 악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중국의 퇴행적인 현재 권력 시스템에 저항하려 했는지 또는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독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