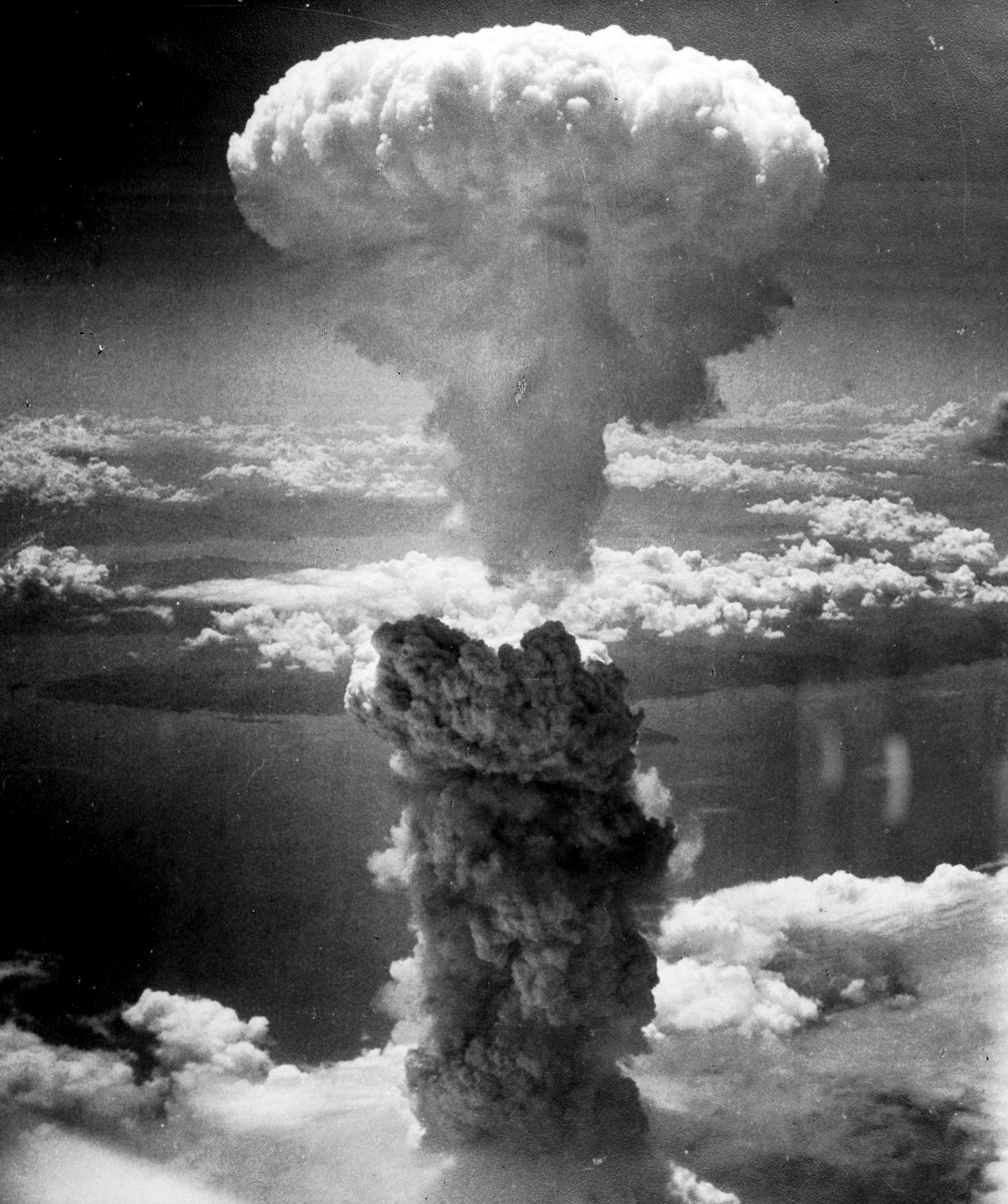스탠리큐브릭의 작품들
올해 초, CGV가 기획한 스탠리큐브릭 시리즈展에서 본 영화들이다. 이때 2001: A Space Odyssey, A Clockwork Orange, The Shining, Dr. Strangelove를 일주일에 걸쳐 감상하였다. 작은 모니터로 봤던 영화를 스크린에서 접하면 이제까지 못 봤던 새로운 디테일을 보게 되는 법이고 큐브릭의 영화들이 바로 그러했다. 특히 스페이스오디세이에서의 우주의 광활함을 작은 모니터에서 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부조리한 상황이었다. CGV가 내년에는 남은 큐브릭의 작품도 상영해주길 빌어본다.
사티야지트 레이(সত্যজিৎ রায়,)의 ‘대지의 노래’ 3부작
남들이 그렇듯 인도영화 하면 무조건 군무와 어설픈 스토리가 결합된 우스꽝스러운 영화라고 알고 있던 나의 편견을 깨부순 영화들이다. 장 르느와르에게 사사한 감독이 1955년 거의 혼자의 힘으로 만들다시피 한 ‘대지의 노래’는 가난한 아푸의 가족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개척해나가는가에 대해 그린 리얼리즘 영화다. 감독은 이어지는 ‘대하의 노래’, ‘아푸의 세계’를 통해 아푸의 삶을 계속 조명하며 인도 근현대사에서의 한 개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인도영화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구축하였다.
I, Daniel Blake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또 하나의 감독이 있다면 바로 켄로치일 것이다. 영국 노동계급의 삶에 대한 애정을 흔들림 없이 지니고 있는 감독의 최신작으로 영국 복지제도의 부조리함과 이에 맞서는 다니엘 블레이크의 삶을 희비극의 기법으로 조명하였다. 지난 번 글에 썼듯이 선진국의 고령화 현상은 특히 노동계급의 빈곤과 맞물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처지를 조명하고 있다. 너무 리얼하다는 점에서 장르는 공포영화다.
Love Is Strange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뉴욕의 게이 부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피치 않게 별거를 하게 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소재로 한 영화다. 모두들 친한 친구고 친척이지만, 그들의 삶의 공간과 시간이 조금씩 겹치면서 서로가 어떻게 부대낌을 겪게 되는 지가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어 보는 내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영화 내내 흐르는 쇼팽의 음악과 뉴욕의 풍경이 그럴싸하게 어울려 더욱 영화 보는 맛을 느끼게 한다. 뉴욕에 갔을 때는 주인공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해 덕질을 하기도 했다.
The Wire
미드 역사상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탑3에 들어가곤 하는 HBO(2002~2008년 방영)의 드라마. 전직 볼티모어의 경찰이었던 에디 번즈(Ed Burns)의 각본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볼티모어라는 도시를 둘러싼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데, 작품은 시즌마다 마약, 정치, 노조, 교육, 언론 등 주요 이슈를 건드리며 하나의 거대한 콘텍스트를 완성해나간다. 이 작품을 보고나서 볼티모어 출신 흑인 작가 타네히시 코츠(Ta-Nehisi Coates)의 ‘세상과 나 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The Wire가 현실로 와 닿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