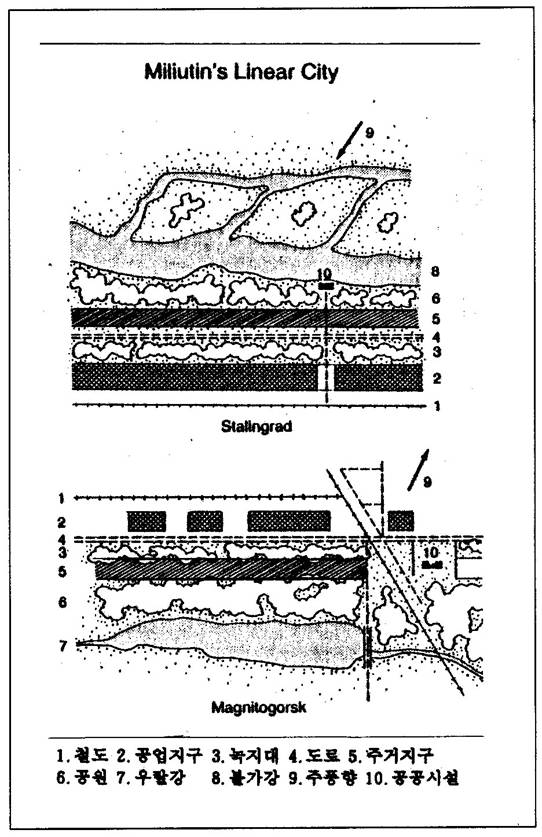글을 써야할까?
sonnet님의 이 글에 대해 응대하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요즘 바쁘기도 했거니와 좀 찝찝한 점이 있어 글쓰기를 몇 차례 망설였었다. sonnet님이 지난번에 쓴 내 글에 트랙백을 걸어주셨고 또 글 서두에 “근원적 모순론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말한다”라며 나의 글을 인용하셨기에 나는 ‘당연히’ 내가 주장한 바에 대한 반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근원적 모순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든 예는 ‘증권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자율화와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였다.
의아한 점은 사실 나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탈규제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위에 든 두 가지 사례를 적시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조치가 기본적으로 사리에 맞는 것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나의 “근원적 모순론”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sonnet님의 논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더욱이 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든 예인 소비에트의 어처구니없는 규제도 왜 그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할 말로 내가 여태 글을 쓰면서 소비에트식 규제에 찬성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글의 논지는 결국 규제완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선의의 것’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sonnet님이 규정하신 “근원적 모순론자”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 궁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원적 모순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개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규제완화의 유용성을 논하는 것이 같은 수위에서의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sonnet님의 주장은 ‘규제옹호론자’ 또는 ‘정부개입주의자’에 대한 반박이라는 생각이 든다.
좌우지간… 지금 (망설이면서) 응대의 글을 쓰고 있다. 주의하실 점은 sonnet님의 글이 워낙 다양한 방향에서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 글도 불가피하게 다소 장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sonnet님의 논지 요약
sonnet님의 글은 보통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주1) 내 글을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그의 글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1) 이번 위기는 경쟁 촉진이나 금융복합기업화 같은 멀쩡한 정책개혁의 결과가 의도치 않았던 귀결(unintended consequence)이며 그런 것을 두고 “언제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근원적 모순론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2) 규제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경쟁과는 꽤 다른 특성(중요함)을 갖긴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선택지 중 일부의 기대값을 바꿔놓는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정책은 상당한 확률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게 된다.
3)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들이 일거에 몰락하게 된 원인은 과거 건전한 개혁정책이라고 생각되었던 모종의 진보의 도입에 있었다. 또한 현상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진보의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불만족스러운 현상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것은 (과거의) 진보적 시도의 잘못을 두들기는 것이 되어서 자승자박이 된다.
4) 급진주의자들은 기존 체제에 존재하는 선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골몰한 나머지, 기존의 선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함이 없이 그것마저 파괴해버리고 만다.
5)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 경쟁정책이 재앙을 촉발했다고 해서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쟁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다른 기적의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쟁정책은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우리의 도구 상자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물론 앞으로도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게 되자, 투자은행이 움켜쥐고 있던 전통적인 밥그릇을 상업은행들이 파먹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Barry Eichengreen, 경제 위기의 해부학, 2008년 9월 22일, sonnet님이 인용]
그런 위험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미묘한 균형을 통해 억제하고 있었던 것은 투자은행들이 갖고 있던 짭짤한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S&L의 (프리미엄 붙은) 영업권, 그리고 잠재적 경쟁업체 진입을 막아주던 글래스-스티걸 법 같은 소위 철밥통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었다는 것이다.[sonnet]
인용한 글에서 sonnet님은 인용한 아이켄그린의 논지를 빌어 증권중개인 수수료 획일화와 글래스-스티걸 법이 투자은행을 철밥통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의 폐지는 경쟁을 촉진하는 선의의 의도였다고 정당화하고 있다.(주2) 그렇다면 글래스-스티걸 법이 그토록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였는지를 살펴보자.
1920년대 증권 붐이 일어날 당시 은행의 대출수요는 감소한 반면 연준의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예금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은행들은 증권투자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주가 대폭락이 나타나면서 은행의 도산이 이어졌고 결국 대공황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의 증권거래관련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서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가 흔들렸고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은행법 개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에 따라 1934년 6월까지 은행업무(상업은행업무)와 증권업무(투자은행업무)를 겸영하던 미국의 은행들은 업무를 분리해야만 했고 약 1/3정도가 상업은행업무에 전문화하게 된다.[미국자본주의 해부, 홍영기(금융감독원), 풀빛, 2001년, pp192~193]
이 글에서 보다시피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은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나아가 바람직한 규제였다. 은행과 증권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물론 유니버셜뱅킹도 가능한 업역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초기 시절 공황을 목도한 뒤 고유업무 영역을 분리했다고 그것을 철밥통을 만드는 경쟁저해책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 규제는 sonnet님이 예로 든 소비에트의 규제보다 훨씬 적절한 규제의 사례다.(이는 조금 뒤에 알아보자) 더불어 그러한 규제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 시절의 종말과 정부개입주의적인 시절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 Leach Bliley Act)의 입법과 이로 인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는 또 다시 경제 자유주의의 복권, 금융과점의 허용 등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이었다.
먼저 규제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sonnet님은 ‘3. 규제라는 도구’에서 소비에트의 예를 들며 규제의 무용성 내지는 외부효과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셨는데 사실 굳이 규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했을 것 같으면 앞서 ‘2. 금융위기 돌아보기’에서 예로 들었던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해 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규제의 양면성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글래스-스티걸 법의 의의와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글래스-스티걸 법이 금융복합기업화를 막아서 투자은행의 안정성을 해쳤거나 경쟁을 저해해서 미국금융시장의 발달을 지연시켰다고 보는가? 글래스-스티걸 법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금융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꼭 그것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이 부당한 악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금융억압의 시기가 지니는 의미인데, 즉 일반적으로 금융억압의 시기라 불리는 브레튼우즈 체제인 1946년에서 1973년까지의 기간 동안 체계적인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그 법은 그 법이 가지는 한도 내에서 역할을 마땅히 수행한 것일 뿐이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 현재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레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아이켄그린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투자은행이 불안정한 단기자금시장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금을 사용해 그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두둔했지만 투자은행 자신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고위험의 투자를 마다하지 않았다. sonnet님 표현을 흉내내자면 경쟁을 시켰는데도 레버리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주3)

특히 여기서 탈규제의 더 비참한 드라마가 연출된다. 즉 레버리지의 증대는 이 조치와도 연관 있는데 탈규제의 하이라이트를 들라면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보다 이른바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이라는 어이없는 제도였다 할 수 있다.
NCR(주4)제도는 비록 정치하고 세련되지 못한 매우 단순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2004년까지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훌륭히 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다.
SEC(주5)는 2004년 6월 8일,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감독권한은 없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CSE)을 마련했다.
…
대형 투자은행들은 집요하게 앞에서 살펴본 표준 NCR 제도가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CEO였으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Paulson이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자마자 곧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 Lynch, Lehman Brothers, 그리고 Bear Stearns 의 5개 대형 투자은행은 SEC로부터 CSE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 5개 투자은행이 CSE 자격을 획득한 유일한 투자은행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월가의 금융위기에서 모두 부실화된 투자은행들이기도 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월가의 금융위기와 자기자본규제, 연구위원 한상범, 자본시장 Weekly 2008-40호 II, 한국증권연구원, pp2~3]
이러한 5대 투자은행들의 “자발적 감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 이전까지 그나마 12배를 유지했던 이들의 레버리지는 2004년의 예외인정 이후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40배까지 상승한다. 12배의 레버리지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40배면 문제가 심각하다. 요컨대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이미 7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금융규제 완화의 사후적 승인(주6)이라면 이 조치는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결정타라 할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사리에 맞는 선택”을 집어낼 수 있는가? “경쟁촉진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아이켄그린의 말대로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M&A는 권모술수와 배신을 동반한다. 탈법, 아니 M&A 성사를 위해 아예 법을 바꾸는 로비도 동원된다. 합병 후 시티그룹의 CEO가 된 샌포드 웨일은 자신의 회사 트레블러스와 시티콥을 합병하는 데 반독점법인 글레스-스티걸 법이 방해가 되자, 워싱턴에 전방위로비를 벌인다. 1999년 미국 의회는 ‘시티그룹 정당화법’이라고 불린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거대공룡’ 시티그룹의 탄생을 방조한다. 합병을 위해 정치인을 움직여 법도 바꾸는 마당이니 M&A 금융기술은 물론, ‘마카로니 방어전략’, ‘독약 전략’ 같은 반(反) M&A 금융기술도 만만찮게 발전한 곳이 월가다.[‘월가의 법칙’ 책 소개]
[기타 참고글]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 로비의 짧은 역사 (번역문 보기)
How Citigroup’s CEO rewrote the rules so he could live richly. (부분번역문 보기)
요컨대 아이켄그린은 그 법의 폐지가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입법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며 미국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존속하였다가, 폐지 이전부터의 은행 간 합종연횡 등이 점차 노골화되는 등 금융억압이 해체되어가자(주7)시효를 다하고 사라진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진 사태는 다 알다시피 현재의 금융위기다.
글을 마치며
sonnet님의 이어지는 ‘4. 파괴적 경쟁’, ‘5. 진보의 딜레마’, ‘6. 편견(?)의 옹호’ 절은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 솔직히 쓰다 지친 면도 있음 🙂 – 여기에서 별도로 다루진 않겠다.(주8) 다만 맨 마지막에 ‘7. 마무리 : 던져진 질문에 대하여’의 sonnet님의 다음 말씀에 대해 한마디 하기로 한다.
경쟁과 분권화는 분명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 경쟁정책이 재앙을 촉발했다고 해서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쟁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혹은 그 이상) 돌아가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다른 기적의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쟁정책은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우리의 도구 상자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물론 앞으로도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위기를 넘긴다면 예전과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시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 내 대답이다. 이제 근원적 모순론이 답할 차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뜯어고쳐야 충분하다고 말할 것인가? ‘시장으로 복귀’란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큰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살짝 잽을 피하시는 모습은 조금 실망”(foog)스러운 것이 어느 쪽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말이다.[sonnet]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글래스-스티걸 법은 경쟁을 저해하는 법이 아니었다. 시장의 플레이어의 특성에 따라 그 고유 업무를 구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법은 존속기간 동안 끊임없는 폐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작동하였다. 그때의 시장은 국가가 특정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한 시장이었다. 그 기간 동안 금융은 탈 없이 굴러갔고 전 세계 자본주의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가 포디즘 체제 하의 경기변동, 미국이라는 나라의 비효율성 증대로 말미암아 금융탈규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것이 경쟁촉진이었는지 독과점 창출이었는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적어도 글래스-스티걸 법을 보면 마냥 “사리에 맞는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상업은행의 거대화를 촉진하였으니 말이다.
나는 시장과 국가를 대립항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동반자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국가는 사실상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경제가 막을 내린 이후 언제나 시장을 지도해오고 투자해왔다. 규제와 탈규제를 반복하고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는 10%미만이었던 서구의 GDP 대비 정부총지출은 1990년대 중반에 40~50%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가개입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 규제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화에 불과하다.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룰을 정하겠다는데 그게 불합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sonnet님이 경쟁과 분권화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라고 하셨는데 여태 말했듯이 자본주의에서의 탈규제 심지어는 규제 그 자체조차도 독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것들도 많거니와 그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는 사리에 맞지도 않았고 의도치 않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도 아니다.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에 위험하다는 신호는 이미 S&L 사태 때 감지하지 않았는가? 나는 최소한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력을 가진 시장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어느 기간만 지나면 편리하게 과거를 망각한다. 이번은 다르다고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다. 나는 이게 시장의 고유모순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다.
- 이 스크롤의 압박은 논쟁 시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점은 글이 긴 관계로 상대가 글을 허투루 읽을 수 있다는 점이고 장점은 글이 긴 관계로 상대가 글을 허투루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
- 잠깐 곁다리로 새자면 벌써 이 부분이 정책이 “상당한 확률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게 된다”며 거부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탈규제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은 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 물론 아이켄그린은 이에 대해 “복합기업화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말이다
- 표준 순자본규칙(Uniform Net Capital Rule)의 약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제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사실 이미 70년대 후반 이래 은행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글래스-스티걸법상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거나 법률 해석상 진출이 가능한 증권업무분야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중략) 금융자유화, 규제완화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분업주의적인 관리된 금융시스템의 일정한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체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정합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미국 자본주의 해부, 홍영기[금융감독원], 풀빛, 2001년, p198)
- 앞서 말했듯이 시티은행의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 Leach Bliley Act)이 허용되기 이전인 지난 98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트라벌러즈 그룹(Travelers Group)이라는 보험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승인을 얻었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제이피모건(JP Morgan)이라는 투자은행과 체이스맨하턴뱅크(Chase Manhattan Bank)가 합쳐진 금융그룹이다.
- 그리고 하나 하나가 모두 심각한 주제여서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측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