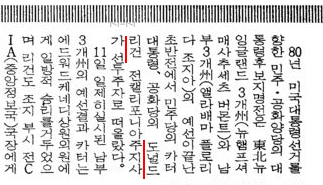어떤 소년들은 내게 키스하고 어떤 소년들은 껴안는데
뭐 괜찮아.
만약 그들이 적당한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돼.
Some boys kiss me, some boys hug me
I think they’re O.K.
If they don’t give me proper credit
I just walk away
(Madonna – Material Girl)
유난히 천진난만한 코맹맹이 목소리로 신용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애정관계를 묘사한 마돈나의 명곡 Material Girl. 마돈나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material world)에서 사는 것을 알지 않느냐”면서 “난 물질적인 소녀야”라고 선언한다. 이 노래는 그녀의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인 Like A Virgin의 수록곡이다.
이 앨범이 발표된 1985년의 미국은 마돈나가 이야기한 바대로 물질적인 분위기가 충만할 때였다. 이 시기, 대통령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었고, 경제는 활황세였기에 말 그대로 “돈이 말을 하는” 시기였다. 당시 분위기는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미국의 싸이코(American Psycho)’에 잘 표현되어 있다.
넌 네 자신이 커다란 자동차의 운전대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넌 네 자신이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넌 이렇게 자문할지도 몰라. 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You may find yourself behind the wheel of a large automobile
You may find yourself in a beautiful house with a beautiful wife You may ask yourself, well, how did I get here?
(Talking Heads – Once In A Lifetime)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유머러스한 경제학자 사트야지트 다스는 ‘부채’덕분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흠~ 아닌 게 아니라 그래프를 살펴보니 마돈나가 “난 물질적인 소녀야.”라고 외치고 있던 시점에, 미국의 싸이코가 친구의 명함이 자기 명함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사실에 눈썹이 떨리던 시점에 미국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돈나를 껴안으려는 소년이 제공하는 신용이나 싸이코가 만든 고급 명함의 재원은 바로 빚을 통해 조달한 것이 되는 셈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때쯤이면 미쏘 대결구도에서 강경노선을 택한 레이건은 군비확장을 위해 빚을 늘렸고, 소련의 패배가 확실해진 일극(一極)체제에서 미국은 더 거침없이 빚을 늘렸다.
이렇게 빚이 는다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다. 당시는 영미권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전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자들을 살벌하게 길거리로 내쫓던 시기였다. Fed 의장인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살인적으로 올려 채무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냈다.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당신은 공공의 적인 10번지(다우닝가 10번지인 영국 수상관저)에 의해 위협받게 될까요?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
당신의 임금인상은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잉여를 취하고 당신만 책임을 집니다.
Are you gonna be threatened by
The public enemy No. 10
Those who play the power game
They take the profits -you take the blame
When they tell you there’s no rise in pay
(The Style Council – Walls Come Tumbling Down)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는 거품이 생겨나는 경제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풍성하고 과장된 스타일이 유행했다. 머리는 한껏 치켜 올려 세웠고, 어깨선에도 과장된 디자인이 적용됐다. 대중음악들도 마돈나의 노래처럼 화려하고 거침없고 빠른 템포의 춤곡이 인기를 얻었다. 화장을 한 남녀들이 저마다의 미모를 뽐냈다.
이제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 경기순환론을 믿는 이라면 사회의 생산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혁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런 시기가 다시 온다면 사람들은 이전에 얻은 교훈을 통해 보다 현명한 경제활동을 할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난 물질적인 소녀야”라고 외칠까?
그렇지만 내 희망을 봐. 내 꿈을 봐.
우리가 쓴 현찰들.
(오~) 난 당신을 사랑해. 오~ 당신은 내 월세를 내주지.
(오~) 난 당신을 사랑해. 오~ 당신은 내 월세를 내주지.
But look at my hopes, look at my dreams
The currency we’ve spent
(Ooooh) I love you, oh, you pay my rent
(Ooooh) I love you, oh, you pay my rent
(Pet Shop Boys – 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