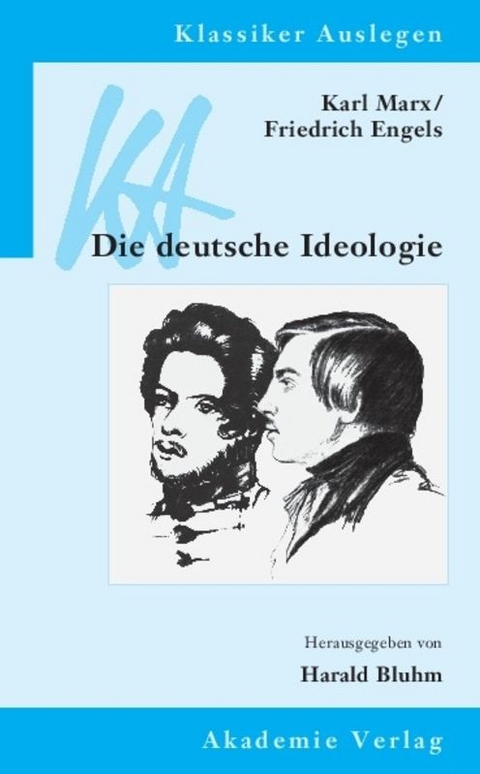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에 관해 좋아하는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다. : 미래의 불황에 대한 예측을 요청받았을 때 당신은 언제나 “약 40%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왜? 50/50은 동전 던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질없다. 75/25는 너무 일방적이다. 40%는 딱 적절한 예측이다. 40%라는 예측이 유용해보이게 해주는 것은 만약 불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내가 예측했듯이 불황은 확률이 낮은 이벤트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만약 불황이 발생했다면 당신의 경고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발생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확률로(예를 들면 40%) 경고한 것이다.[Can Economists Predict Recessions?]
이 블로그에서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엉터리 예측을 조롱한 글을 몇번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기존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춘 이라 할지라도 그 패턴을 경험삼아 미래를 예측하기란 – 물론 여러 이유로 본인의 의견과는 다른 시장이 좋아할만한 의견으로 인기를 얻기 위함도 있다 –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용한 농담은 그러한 만만치 않은 경제학자(또는 통계학자, 또는 분석가)의 태생적 임무의 고단함에 관한 농담이라 생각된다.
경제에 관한 입장 차이는 흔히 미래에 대한 이러한 당파성 혹은 주관적 희망이 섞인 예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장자유주의자라면 시장이 어떻게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사회주의자라면 시장이 가진 고유한 모순으로 인해 현재의 난관이 심화될 것이라 예측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이 미래예측을 40%의 확률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면 본인의 분석력에 대해 큰 비난은 받지 않을지 몰라도 양측의 호감을 얻는데는 실패하거나 미디어적 상업성이 떨어질 것이다.

By Diacritica – , CC BY-SA 3.0, Link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특히 경제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는 미래에 대해 40% 이상의 확률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한다’ 혹은 ‘증세를 해야 한다’의 의사결정은 40%의 확률을 본인이 원하는 더 개선된 이벤트의 확률로 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과정은 상당 부분 좌충우돌이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고, 금리를 낮추면 자산거품이 도래했다.
그 즈음이 되면 경제학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그 좌충우돌에 대해 ‘내가 40%의 확률로 부작용을 예측하지 않았느냐’하고 꾸짖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좌충우돌이 시행착오를 통해 사회의 정치적 합의로 도출되는 것이라면 희망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정치적 양분화만 가속화시킬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면 경제학자는 더 이상 40%의 확률을 제시할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비극이다.